☯ 중용 인간의 맛 제13강 공포와 우환
♣子曰: “道其不行矣夫도기불행의부!”
☞제1장은 총론이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時中시중, 能久능구,
知味지미는 모두 도가 행하여지고 있지 못한 부정적 사태의 개탄이다.
제5장인 본장은 이러한 개탄을 극도로 심화시켰다.
제6장부터는 긍정적인 사태로 전환된다.
♣子曰: “道不行도불행, 乘桴浮于海승부부우해. 從我者종아자,
其由與기유여?” 子路聞之喜자로문지희. (논어)(공야장)6
☞“바다에 둥둥 떠 있고 싶다.”하는 것은 “道不行도불행”이라고 하는
절망감에 상대적으로 상정된 공상이다. 바다는 미래의 기약이 없는
혼돈이요 카오스이다. 육지의 질서로부터 해방된 공간인 동시에 미지의
암흑이요 무질서요 죽음이다.
☞憂患우환: 先秦성진 고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서 중국철학의 주요개념.
우환은 일상생활의 得失득실에서 오는 걱정이 아니며, 실존철학에서
말하는 조르게나 앙그스트와도 다르다. 막연한 불안이 아니다.
☞憂患우환은 大人대인의 우환이다. 우환은 杞人憂天기인우천의 무료함도
아니요, 患得患失환득환실의 용속함도 아니다. 그것은 덕을 못 닦음과
배우지 못함을 걱정하는 호호탕탕한 胸懷흉회이다.
☞인간의 욕구의 충족과 고통으로부터의 도피를 항상 갈구한다.
느낌과 바람이야 말로 모든 종교의 근원이다. 인간이 제일 먼저 부닥친
것은 恐怖공포이다. 굶주림, 야생동물, 질병, 불의의 죽음, 이모든 것이
공포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공포가 언어화될 때, 그것은 신이 되고 그것은 반드시 인격화 된다.
그 인격적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달램의 축제를 벌여 인간은 자신의
공포를 덜어냈다.
☞인간 사회에는 반드시 종교적 축제가 있다. 그 축제는 반드시 그것을
사제계급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제계급은 예외 없이 정치권력과
결탁한다. 사제계급과 정치권력의 융합을 祭政一致제정일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제정일치 때문에 종교는 인간 세에서 사라질 수 없는
조직적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종교는 모두
“공포종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天子천자: 중국에서 王왕을 부르는 호칭,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복음서기자들이 예수를 기술한 표현과 형식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적 예수는 자신을 “人子인자”라고 호칭하지 않았다.
☞인지의 발달로 자연의 인과현상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생겨나면서
공포는 완화된다. 이 단계에서 공포종교는 윤리종교로 진화한다.
☞인류의 대부분의 고등종교는 공포종교에서 윤리종교로 진화한 것이다.
그러나 윤리종교는 어디까지나 인격신의 초월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공포종교의 뿌리와 근원적으로 다르지 않다.
☞공포종교→ 윤리종교→ 천지종교→ 천지종교에서는 天地천지 그자체가
聖化성화 된다.
☞근대르네상스시대는 하나님이 자연에 대한 입법자로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은 대립되는 존재로서 분열되었다.
☞동방인의 종교 관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칙과 천지의 법칙이 이원적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 유교의 휴머니즘은 신성을 거부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모든 신성을 포섭하는 인문사상이다.
☞“객관성”이라는 말 한마디가 과학법칙을 우리의 도덕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켰다. 그러나 과학법칙은 결코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다.
☞유럽의 가속기실험에서 중성미자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측정사례가 보고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도
수정 불가피하다.
☞자연의 법칙적 운행은 인간으로부터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인간의 종교적 정서의 심연일 수도 있다.
인격적 신을 전제하지 않는 천지종교에서는 과학법칙 그자체가 인간의
도덕의 근원으로 인지된다.
☞동방인 에게는 자연의 법칙 그 자체가 “다스 하일리게”즉 “聖성”이다.
그것을 (중용)의 저자 子思자사는 “誠성”이라고 불렀다.
☞21세기의 과제상황은 과학법칙을 우리 삶의 도덕적, 종교적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진화시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말한다.
“자연의 인과에 개입하는 비인과적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과학자들이
수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탐색을 계속하는 이유는 우주 그 자체를
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우주종교라 부른다.“
☞불교은 一切皆苦일체개고: 諸行無常제행무상, 諸法無我제법무아와 함게
불교의 근본원리에 속한다. 연기설에 있어서 생로병사의 모든 현실세계의
과정이 “苦고로서 나타난다. 고의 근원은 번뇌이다. 따라서 인간은
번뇌를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한다.
☞불교: 苦業意識 고업의식
☞기독교: 罪業意識 죄업의식
☞유교: 憂患意識 우환의식
☞창세기의 유대교 하나님의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었다. (창세기 1:27) 아담을 만들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 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 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19~24)
☞타락: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원죄를 짓게 되었고 실낙원을
초래했다. 그것이 삶의 苦고의 근원이다. 타락을 전제함으로써 인간은
구원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罪죄와 苦고에 시달리는 존재로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천지대자연의 誠성을 집약한 도덕적 주체로서 파악할 수도
있다. 유교는 그 출발부터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인간에게는 어두운 負面부면이 있는가하면, 밝은 正面정면이 있다.
서구사상(인도유러피안어군의 사유체계)은 인간의 부면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유교는 전면으로부터 출발한다.
☞脩身수신의 과제상황은 반드시 五倫오륜의 관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사회의 구원과 일치되어야 한다.
바르게 도덕적인 사람은 항상 사회에 대한 우환의식을 갖는다.
동방사상의 핵심은 “內聖外王내성외왕”의 사상에 있다. 안으로는 성인이
밖으로는 바른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회조직에는 지도자가 없을 수가 없다.
☞인간을 처음부터 도덕적 주체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의
검증이 아니다. 서양철학의 모든 인간규정도 형이상학적 가설일 뿐이다.
☞易之興也역지흥야, 其於中古乎기어중고호!
作易者其有憂患乎작역자기유우환호!
(주역)(계사)에서는 易역이 우환에서 흥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貴大患若身귀대환약신. 何謂貴大患若身하위귀대환약신?
吾所以有大患者 오소이유대환자. 爲吾有身위오유신.
及吾無身 급오무신. 吾有何患오유하환? (노자)제13장
인간이 몸身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인간에게 憂患우환은
떠날 수 없다. 해탈도 구원도 결국 다 몸의 문제이다.
☞제2의 아담: 첫 아담은 타락의 인성을 상징하고, 두 번째 아담은 부활을
통하여 원죄로부터 해방된 인성이다. 두 번째 아담이 곧 예수이다.
제2의 마지막 아담은 죽은 인간을 살려주는 영이다. 롬 5장. 고전 15장
☞유교는 신앙에 의한 인간의 일시적 구원을 근원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인간의 수신의 기나긴 과정이 없이는 갑작스러운 “죄사함”이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불교의 頓悟돈오와 비슷한 논리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줄을 믿노니” 롬 6:8
☞인간은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매우 가혹하지만 너무도 정직한, 유교의 인간관이다.
♣惻隱之心, 仁之端也 측은지심, 인지단야:
羞惡之心, 義之端也 수오지심, 의지단야:
辭讓之心, 禮之端也 사양지심, 예지단야:
是非之心, 知之端也 시비지심, 지지단야. (맹자) (공손추)상
☞惻隱之心측은지심은 仁인 그 자체가 아니라, 仁인 해질 수 있는
端緖단서 일 뿐이다. 端단→ 心심
☞人皆有不忍人之心. 인개유불인인지심.→ 사람들은 모두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퇴계의 입장은 충분히 그 나름대로 도덕적 정당성이 이다.
그러나 유교경전을 정확히 해석한 결과는 아니다.
四端사단은 理리의 문제가 아니라, 心심의 문제이며 精정의 문제이다.
☞凡有四端於我者 범유사단어아자. 知皆擴而充之矣 지개확이충지의.
☞天視自我民視 천시자아민시, 天聽自我民聽 천청자아민청.
무왕이 은나라의 마지막 폭군 紂주를 토벌할 때의 포고문. (서경)(태서)중
국민이 보는 것을 보지 않고, 국민이 듣는 것을 듣지 않는, 정치지도자는
혁명의 대상이다. 반드시 갈아치워야 한다. 맹자는 그는 “왕”이 아니라
“일개 도적놈과 같은 범부”일 뿐이라고 일갈한다.
※ 제13강 핵심
공자는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깊은 탄식을 발한다. 유교에서는
이러한 탄식을 憂患우환이라고 부른다. 기독교의 罪業죄업과 불교의
苦業고업과 구별되는 이 우환의식은 성인이 되기 위한 배움을
지속하는 한, 나의 몸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脩身수신은
반드시 五倫오륜, 즉 사회적 구원의 지평위에서 실현된다.
「도올, 중용 강의에서」 용담
'인문 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중용 인간의 맛 제15강 나는 과연 지혜로운가? (0) | 2017.08.31 |
|---|---|
| ☯ 중용 인간의 맛 제14강 묻기를 좋아하시오! (0) | 2017.08.31 |
| ☯ 중용 인간의 맛 제12강 知味 지미 (0) | 2017.08.31 |
| ☯ 중용 인간의 맛 제11강 能久능구와 삼 개월 (0) | 2017.08.31 |
| ☯ 중용 인간의 맛 제10강 교육의 리듬과 能久능구 (0) | 2017.08.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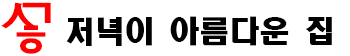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