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용 인간의 맛 제12강 知味 지미
☞천재들은 질서를 갖춘 체재 속에서는 탄생되지 않는다. 중국문명의
위대한 시기는 대체로 혼돈의 시기였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할 때
비로소 문명은 꽃을 피운다. 획일주의는 지성의 사망이다.
☞百花怒放백화노방: 온갖 꽃이 제멋대로 만발한다.
☞百家爭鳴백가쟁명: 다양한 사상가들이 자유롭게 자기 사상을 편다.
☞중국의 선진문명사상은 희랍고전시대보다 훨씬 다양하다. 희랍문명은
결국 아테네 중심의 소수 시민사회의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방대한 열국들이 유세객들의 사상적 실험무대였다.
☞정권이 언론을 획일적으로 장악하면, 그만큼 정권 자체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결국 역사에서 오명의 종지부를 찍는다.
언론 를 폐쇄하고 망하지 않는 정권은 없다. 이것은 역사의 정칙이다.
♣子曰: “道之不行也도지불행야, 我知之矣아지지의, 知子過之지자과지,
愚者不及也우자불급야;
道之不明也도지불명야, 我知之矣아지지의, 賢者過之현자과지,
不肖者不及也불초자불급야.
人莫不飮食也인 막부음식야, 鮮能知味也선능지미야.“
☞子曰 파편으로 시작되면 공자의 말씀이고, 자왈이 없는 문장은 모두
자사의 주장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때로는 공자의 말과 자사의 말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중용)원문은 일체 띄어쓰기나 부호가 없다.
☞道之不行也도지불행야, 我知之矣아지지의. 知子過之지자과지,
愚者不及也우자불급야;
☞中庸중용은 실체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서양철학의 오류는 모든 개념을 실체화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子張자장이라는 제자는 過과한 편이고,
子夏자하라는 제자는 不及불급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으로써 중용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논어)(선진)15
☞지혜 智지와 지식 知지은 이원화될 수 없다.
그런데 서양의 필로소피는 지혜(소피아)의 사랑(필로)이면서도,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지식(인식론)만을 추구했다.
♣주희는 知者지자는 知지의 측면에서 과하고 行행의 측면에서 불급하며,
賢者현자는 行행의 측면에서 과하고 知지의 측면에서 불급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공자는 단순한 메시지를 다양하게 반복했을 뿐이다.
☞不肖小生: 부모님의 덕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같지 못한 자식”이라는 뜻.
肖像畵초상화도 실제 모습과 “같다”는 뜻.
☞“같지 않은 녀석”이라는 말은 “같은 듯 하면서 같지 않다”는 뜻으로
“似而非사이비”라는 어원과도 관련 있다.
☞ 知지 → 愚우 賢현 → 不肖불초
☞飮食음식: 마시고 먹는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생리적 욕구의 충족.
♣ 부정부사 조동사 본동사
제4장 鮮선 能능 知지
제3장 鮮선 能능 久구
☞맛은 생리적 욕구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화적 감각이며, 심미적 감성의
압축 태이다. 중용은 과. 불급의 문제가 아니라 맛의 문제라는 것을
공자는 천명하고 있다.
☞맛은 주관적인 동시에 간주관적이다. 개별적인 동시에 공통적이다.
맛은 피상적 차원에서는 매우 주관적 차별성이 있는 것 같지만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생물학적 몸의 共通感공통감에 기초하고 있다.
“밥맛없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모든 판단력이 종합된 고도의 판단이다.
☞“맛味”은 감성과 이성을 매개하며, 감성계와 초 감성계를 다리 놓으며,
필연과 자유를 융합한다.
☞九竅구규: 우리 신체의 아홉 구멍, 동방인은 이 구멍이 몸 내.외의
통로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감각기관의 총칭, 이. 목. 구 . 비뿐만 아니라,
생니라, 생식구멍, 배설구멍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맛있게 먹는다”와 “맛있게 싼다”는 동일한 차원의 몸의 기능이다.
이 양단의 맛의 평형이 곧 중용이다. 위장 관 전체가 맛의 세계이다.
♣“修道之謂敎수도지위교” “敎교”는 맛을 아는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다.
맛은 전문가의 세계이며, 아마추어에계서 맛을 논할 수는 없다.
맛은 고도의 수신을 통해 달성된다. “맛은 멋이다.”
☞멋은 우리 몸의 궁극적 도덕성이다. (도올)
☞멋이란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낭비 없이 달성하는 데서
생겨난다. 멋은 도덕성이며, 도덕성은 경제성이다.
☞건축공간은 기하학적 공간이 아니라 기의 공간이며 삶의 공간이다.
그것은 도덕으로 충만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건축공간은 우리 삶을 질서 지우는 도덕적 행위이다.
의과대학에서도 의료윤리를 가르치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윤리를 안
가르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건축은 기하학적 장난이 아니다.
☞(대학)이라는 고전은 인간의 맛을 인간의 마음과 연결시켰다.
마음이 바르지 않거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맛을 알 길이 없다고
했다. 心不在焉심불재언, 食而不知其味식이불지기미. (고본대학한글역주)
☞“맛”은 문화상대주의적인 소산이기도 하지만, 인간이라는 감성의 조건에
고통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맛은 주관적이지만 間主觀的간주관적이기도 한 것이며,
상대적인 동시에 절대적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즉 맛은 이성과 감성을 매개하며 주관과 객관을 통합하며 상대와
적대를 통섭하며 인간과 하나님을 융합하는 것이다.
맛은 예술이나, 인품이나, 과학이나, 논리, 그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우 경제적인 스타일을 형성하는 심미적 감성이다.
☞순수이성: 인과가 지배하는 필연, 감성계, 과학,
실천이성: 경험의 한계를 넘어가는 자유, 초감성계, 도덕,
판단력이성: 감성계와 초감성계의 매개하는 하는것.
☞(칸트)→ 제1비판: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제2비판: 인간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제3비판: 인간은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맛의 세계)
☞맛: 철학계에서 “취미”라고 번역하는데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미를 판정하는 능력, 공통감과 같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
☞맛의 인간은 과학적 법칙의 세계와 도덕의 세계를 통합한다.
과학과 도덕이 통합되어야만 참된 종교를 운운할 수 있다.
☞맛은 전문적 工夫공부의 산물이다. 맛은 교육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통합한다. 맛은 전문성을 문명에 제공하는 創新창신의 文化문화이다.
※ 제12강 핵심
지식과 지혜는 이원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식이 없는 것이다. 중용은 과. 불급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맛을 아는 것이다. 맛은 감성과 이성을 필연과 자유를 과학과 도덕을
통합한다. 맛은 멋이다. 멋은 우리 몸의 궁극적 도덕성이다.
☞맛을 아는 멋있는 인간이 되자!
「도올, 중용 강의에서」 용담
'인문 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중용 인간의 맛 제14강 묻기를 좋아하시오! (0) | 2017.08.31 |
|---|---|
| ☯ 중용 인간의 맛 제13강 공포와 우환 (0) | 2017.08.31 |
| ☯ 중용 인간의 맛 제11강 能久능구와 삼 개월 (0) | 2017.08.31 |
| ☯ 중용 인간의 맛 제10강 교육의 리듬과 能久능구 (0) | 2017.08.31 |
| ☯ 중용 인간의 맛 제9강 時中시중, 타이밍의 예술 (0) | 2017.08.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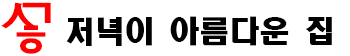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