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용 인간의 맛 제4강
☞ 배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일이다.
옛 동방인들은 이를 “大人대인을 만나다.”(利見大人,주역)라고 표현했다.
☞ 한 철학자의 사상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哲學史철학사를
읽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에 관한 좋은 개설서를 읽어라!
다음으로 그의 작품을 독파하라!
☞ 현대 서양에서도 학문의 바탕은 여전히 희랍, 로마고전이다.
한국인의 인문학의 바탕은 동방고전일 수밖에 없다.
고전의 소양이 없는 학문의 자격이 없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참다운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고전을 읽어야 한다. 동 서 고전을 가리지 말고 읽어라!
☞ 서양고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서양문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서양문명의 꼭두각시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서양을 배움으로써 서양을 극복해야 한다. 그 극복의 길에서 반드시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 것이 동방의 고전들이다.
☞ 作者之謂聖작자지위성, 창조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인이다. -禮記예기-
☞ 음악의 역사는 연주의 역사가 아니라 작곡의 역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재가 연주에만 몰리고 작곡에는 몰리지 않는다.
그대들은 지식의 소비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지식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내용은 직관이라 부르고, 형식은 개념 혹은 사유라고
부른다. “순수이성비판” 제2부 선혐적 논리학, 들어가는말.
☞ 인식론: 근대 서양에서 과학의 발흥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학문체계, 앎의 성립과정과 그 한계를 밝힌다.
☞ 내용과 형식을 합이 앎이라한다. 내용은 感覺所與감각소여: 우리의
감관을 통하여 주어지는 감각자료.
☞ 형식은 悟性오성의範疇범주: 칸트의 용어. 우리 이해력의 기본이
되는 선천적 논리적 개념 구조.
♣ 칸트는 우리의 앎이 경험과 더불어 시작하지만 경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칸트는 영국 경험론전통과 대륙 합리론전통을 종합하여
근대계몽주의 철학을 완성했다.
☞ 구성설: 세계는 감관에 묘사되는 것이 아니리
우리의 선험적 의식이 구성해내는 것이다.
☞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오성의 범주가
창조한 것이다. -칸트-
칸트철학은 근대적 인간, 그 진정한 주체의 탄생이다.
☞ 오성의 범주는 인과관계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성의 범주가
구성해 놓는 세계는 인과론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감성을 이탈하지 않는다.
☞ 하나님은 실천이성의 요청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 삶의 도덕적
기저로서 요청되는 것이며 존재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율배반 (안티노미)의 대상이다. -칸트-
♣ (중용)의 저자 子思자사는 칸트와 같은 인식론적 순수성을 지향하지
않는다. 초험적 자아가 있어 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지도 않는다.
인간은 인식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천지와 교섭한다.
그리고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은 분열되지 않는다.
※ 제4강 핵심
칸트철학은 서구 근대 계몽주의의 완성인 동시에 근대적 인간에
대하여 명백한 한계를 부여하였다. 인간의 위대성과 인간의 겸손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혔다. 지금 한국사회는 젊은 학도들의 학문적 업적이
비약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자신의 철학을 창조해야할
시점에 왔다. 조선의 젊은 학도들이여! 분발하라! 노력하라! 창조하라!
☞ 문1. 오성의 범주에 의한 인식의 보편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문2. 인식의 선험성은 또다시 신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닐까?
문1.답 양, 질, 관계, 양태, 각각 3개식 나뉘는 12범주. (순수이성 형식)
칸트가 말하는 오성의 12범주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형식에서
유래된 것이다. 선험적 개념이 꼭 12개일 필요도 없고,
그것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필요도 없다.
그것은 칸트의 생각일 뿐이다.
문2.답 칸트의 선험적 주관에 관한 것인데 칸트의 인식론적 초월주의는
얼마든지 비판될 수 있다. 모든 초월주의는 초월신관과 관련된다.
☞ 唯我論유아론: 실재하는 것은 나 개인의 자아일 뿐이다.
他我타아의 인식세계도 나의 의식내용일 뿐이다.
☞ 間主觀性간주관성: 복수의 주관에 공통되는 인식, 공통주관, 상호주관
☞ 내가 말하는 간주관은 훗설(1859~1938)이 말하는 간주관보다 더
포괄적이다. 간주관의 궁극적 근거는
몸Mom 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의 보편성이다.
☞ 몸Mom 의 보편성은 형식적 보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몸의 보편성은 우리 인식의 현실적 준거이다.
몸속에는 천지가 들어와 있다.
「도올, 중용 강의에서」 용담
'인문 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중용 인간의 맛 제6강 中중과 和화 (0) | 2017.08.31 |
|---|---|
| ☯ 중용 인간의 맛 제5강 이성과 감정 (0) | 2017.08.31 |
| ☯ 중용 인간의 맛 제3강 (0) | 2017.08.31 |
| ☯ 중용 인간의 맛 제2강 (0) | 2017.08.31 |
| ☯ 중용 인간의 맛 제1강 (0) | 2017.08.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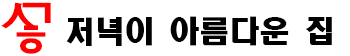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