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용 인간의 맛 제25강 言언과 行행
己所不欲기소불욕, 勿施於人물시어인. (논어)15~23
이 명제는 비단(논어)뿐 아니라, 유대교 지혜문학, 희랍철학,
불교 원시경전, 이슬람 문헌에도 나타나는데 대개 같은 부정형을 취하고
있다. 기독교 황금률만 예외이다.
☞네가 원치 아니 하는 바를 네 이웃에게 베풀지 말라. 이것이 토라의
전체이다. 나머지는 이에 대한 해설일 뿐이다. 부지런히 실천하라.
랍비 힐렐 장로 BC60~AD20, 예수와 동시대인.
☞기독교는 己所欲기소욕, 施於人시어인.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그들에게 행하라. 마태 7:12, 누가 6:31
☞“남에게 베풀라”는 긍정태의 메시지는
오히려 윤리적 보편명제가 되기 어렵다.
☞근대의 식민지주의는 자본과 결합하는 동시에 서구의 言說體系
언설체계와 결합되어 왔다.
그 언설공간은 서구인들의 욕망의 표출의장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거장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합리화”가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한다.
♣君子之道四군자지도사, 丘未能一焉구미능일언;
所求乎子소구호자, 以事父이사부, 未能也미능야;
所求乎臣소구호신, 以事君이사군, 未能也미능야;
所求乎弟소구호제, 以事兄이사형, 未能也미능야;
所求乎朋友소구호붕우, 先施之선시지, 未能也미능야;
☞修身수신 = 愼獨신독
上不怨天상불원천, 下不尤人하불우인. (중용)14장
修身수신이란 “주체의 심화과정”이다.
주체의 종적 심화는 반드시 횡적인 연대, 즉 수평적 인간관계를 통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그 인간관계의 총칭이 바로 五倫오륜이다.
☞君臣군신관계는 하이어라키: 位階秩序위계질서,
모든 사회는 位階秩序위계질서가 없을 수 없다.
☞선진시대의 유교는 이미 20세기 서구의 실존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핵심적 명제가
유교에서는 상식이다.
♣庸德之行용덕지행, 庸言之謹용언지근, 有所不足유소부족,
不敢不勉불감불면, 有餘不敢盡유여불감진.
言顧行언고행, 行顧言행고언, 君子胡不慥慥邇군자호불조조이!
☞(주역)(문언)에는 “庸言之信용언지신, 庸行之謹용행지근”이라는 말로
나온다. (문언)의 표현이 더 정확한 원의를 나타내고 있다.
☞sign: 의미의 대응관계가 1:1이다.
symbol: 의미의 대응관계가 1:多다 이다.
인간이 쓰는 언어는 모든 요소가 고도의 상징체계이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만물의 영장이 되었지만 언어는 항상
인간의 모든 비극의 연원으로 남아있다. 언어는 비극이다!
☞찰스다윈,1809~1882은 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지렁이”를 연구했다.
지렁이는 인류문명을 가능케 한 “흙”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생물로 꼽힌다. 지렁이의 존재는 “至善지선”이다.
☞언어는 인간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대의 전략이다.
☞mother tongue: 엄마의 혀, 이것은 母國語모국어가 아닌 母語모어이다.
母語모어는 반드시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체계는 아니다.
☞이 시대를 지베하는 언어, 즉 에피스팀이 개별적 사고를 빌어 자신을
표현한다. -미셀푸코, 1928~1984-
☞동방사상은 대체적으로 언어의 절대적 가치를 신뢰하는 서방사상과는
달리 언어를 주체를 표현하는 제1차적 매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언어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다.
☞言行一致언행일치라는 명제는 우리 고전의 메시지가 아니다.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의 단순한 정적 일치가 아니다.
말과 행동의 끊임없는 변증법적 동적 교섭의 과정이다.
☞言顧行언고행, 行顧言행고언,
말은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을 돌아본다.
☞서양철학사의 주류는 지식론이다. 결국 그것은 言언의 문제이다.
플라톤에서 비트겐슈타인까지 이 주제의식은 면면이 이어져왔다.
♣子曰자왈: “巧言令色교언령색, 鮮矣仁선의인!” (논어)(학이)3
☞道可道, 非常道. 도가도, 비상도. (노자도덕경)1장
도가사상은 언어를 부정한다. 언어는 실재의 정확한 표상이 아니다.
유가와 도가는 대립되는 두 개의 학파가 아니다.
그 인식론과 우주론을 근원적으로 공유하는 교섭의 두 축일 뿐이다.
☞문명은 언어의 산물이다.
문명의 발전은 언어의 발전과 궤적을 같이하여 왔다.
※ 제25강 핵심
지렁이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행동에 앞서 말을 한다. 그리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다. 인간의 문명은 언어와 더불어 시작하였다. 언어는 문명에
모든 가능한 생명력과 추동력을 부여했지만 인간의 운명에 비극성을
부여하였다.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의 일시적 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은 서로를 보완해가면서 서로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변증법적
관계 항들이다. 말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며 행동은 막을 고양시킨다.
도가는 言언을 부정하고, 유가는 言行언행의 변증법을 말한다.
도올, 중용 강의에서」 용담
'인문 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중용 인간의 맛 제27강 登高自卑 등고자비 (0) | 2017.10.02 |
|---|---|
| ☯ 중용 인간의 맛 제26강 富貴부귀와 斯文사문 (0) | 2017.10.02 |
| ☯ 중용 인간의 맛 제36강 至誠無息지성무식 (지성은 쉼이 없다.) (0) | 2017.08.31 |
| ☯ 중용 인간의 맛 제35강 天下至誠 천하지성 (0) | 2017.08.31 |
| ☯ 중용 인간의 맛 제34강 自誠明자성명 (0) | 2017.08.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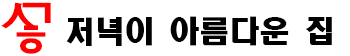
댓글